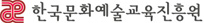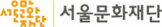지역문화 아카이빙 프로젝트
도봉 아키비스트가 기록하는 도봉의 인물과 공간
지역문화 아카이빙은 도봉이 품은 다양한 문화의 가능성과 지역 자원을 주민이 직접 탐색,
기록하고 구성하여 중요한 홍보 자산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록하고 구성하여 중요한 홍보 자산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봉역사문화길 (2) -천년 고찰길을 따라가는 도봉산행
송주영 |2020-11-26 | 조회 589
도봉산은 예로부터 다양한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산입니다. 예와 풍류를 두루 갖춘 선비뿐 아니라, 참선을 위해 떠나온 불자들도 자주 찾은 산 중 하나입니다.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크고 넓은 산세 때문에 곳곳에 자리한 암자에서 근현대의 수많은 고승이 수련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봉산 천년 고찰길은 수행을 떠나온 불자들의 흔적을 담고 있는 길입니다. 의상대사의 자취가 서린 고찰부터 조선 후기 왕조의 이야기를 품은 사찰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늦가을의 고즈넉함이 가득한 도봉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자연과 하나 된 사찰과 암자의 탐방길을 수행 길에 오른 여느 불자들처럼 걸어볼 참입니다.
141번 간선버스의 종점부터 산행을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 담긴 도봉산 초입에 들어서면 들뜬 표정의 등산객들이 보입니다. 그들과 어울려 걷다 보면 어느새 도봉탐방지원센터 앞을 지나게 됩니다. 전날 내린 비 덕분에 수량이 풍부해진 계곡을 바라보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른쪽 천축사로 향합니다.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오가는 등산객들이 주는 먹을거리에 익숙해진 산냥이 한 마리가 곁에 다가와 ‘그르륵’ 소리를 내며 아는 척을 합니다.

산냥이의 곰살맞은 인사를 뒤로 하고, 100m 정도 오르면 정겨운 나무계단이 나타납니다. 계단의 끝에 다다를 때쯤이면 곧게 뻗은 소나무와 어우러진 도봉대피소가 보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원 전체의 산장을 대피소로 바꾸기 전까지 ‘도봉산장’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 도봉대피소(도봉산장)
이곳 1층에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커피숍과 푸근한 미소로 등산객을 맞이하는 주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체력소모가 많은 등산객에게 커피의 달콤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미로운 비타민입니다. 도봉대피소는 그런 의미에서 등산객들의 비타민 충전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 할머님의 따뜻한 배려와 손때 묻은 살림살이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들로 가득한 정겨운 실내 분위기는 덤입니다.

“커피분쇄기가 낡아 보이는데 얼마나 된 거예요?”
“오래됐어. 나같이 늙어빠졌지 뭐. 그래도 커피는 잘 갈려서 나와. 이게 커피알 크게 한스푼 넣어서 갈면 딱 커피 두 잔이 나온다고.“
“여기 오랫동안 살고 계신 거예요?”
“73년도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50년이 다 됐지. 내가 할아버지 따라서 서른여섯에 여기 와서 80세 할머니가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 됐겠어. 우리 아들은 여기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어. 요즘 엄마들은 상상도 못할 일일거야.”
”하루종일 혼자 보내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 내가 뭐가 무서워. 내가 뭐 누구한테 해코지했겠어,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겠어. 가진 게 많아야 무서운 거지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세요?”
“사람들도 하도 많이 거쳐 가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없는데 뭐, 요즘 사람들은 옛날 같은 느낌이 없어서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해. 뭐든 욕심 없이 넉넉하게 살아야 편안한 건데…. 봄 가을에는 2층에 있는 등산학교에서 수업도 해. 아마 74년부터 시작했을 거야. 지금은 끝났으니 내년에 다시 수업하겠지.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앞으로도 쭉 여기서 사시는 거죠?”
“그렇지. 먹을거나 생활용품은 아들이 가져다주니까 걱정 없고…, 살다 보니까 이젠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할머니가 웃을 때마다 나타나는 얼굴의 고운 실주름과 욕심 없는 대답이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넉넉한 산의 품에 안겨 인생의 늦가을을 맞이한 할머니의 삶이 편안하고 조용해 보여서 부럽다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안전하게 산행하라는 할머님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 하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도봉대피소에서 350m 정도를 걸어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칼로 자른듯이 반듯한 모양의 ‘인절미바위’가 보입니다. 화강암의 일종인 인절미 바위는 박리작용(밤과 낮의 기온차이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현상)에 의해 풍화가 진행되는 바위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모양입니다. 도봉산의 신령들이 등산객들의 허기라도 달래려 만들어 놓은 간식 같다는 상상을 잠깐 해봅니다.

인절미바위에서 15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석굴암, 오른쪽으로 만월암을 알려주는 예쁘고 정갈한 표지석이 보입니다. 만월암으로 향하는 길 군데군데에는 등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파랑새가 길을 알려주는 옛 동화가 생각나는 탐방길입니다.

바위 글씨길을 따라 올랐던 지난 산행에 비교해 천년 고찰길의 산행은 조금 가파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숨을 고르면서 주위의 풍광을 둘러봅니다. 사람이 빚어내기 힘든 자연의 색을 볼수록 산행의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등산객들이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계절마다 변화하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었을까요. 힘없이 떨어져 쌓여있는 나뭇잎들마저 암자의 한 부분인 것 같아서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드디어, 400여 개의 가파른 계단 끝, 커다란 바위 밑에 기묘하게 자리한 만월암에 도착합니다.
만월암은 서울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한 조그만 석굴 암자입니다. 신라 문무왕 시절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지붕을 이루고 있고, 오른쪽 1개의 바위가 그를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며, 그 사이에 조촐하게 공간이 생겨 조그만 자연산 동굴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등산로와 이정표가 있어서 찾기 쉽지만, 옛날에는 찾기 힘들 정도로 외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자들이 참선하기에 그만인 곳이라 오래전부터 ‘보덕굴’이라 불리는 참선 석굴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봉산에는 천축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오랜 고찰이 많아, 절에 머무는 승려들이 수행장소를 어디로 택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구석져 있지만, 심신을 수련하는 곳으로 이곳만 한 곳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주 예전엔 절이나 암자는 없었고, 그냥 참선을 위한 동굴이 전부였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경내에는 석굴 자리에 지은 만월보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산신각 등 건물 2동이 전부입니다. 생기가 서린 듯한 현판이 걸려있는 만월보전에는 백불(白佛)의 석불좌상이 있습니다. 원래 금동불(金銅佛)이었으나 근래에 들어 호분(胡粉, 착색력이 좋고, 색이 들뜨고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예로부터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백색의 대표적 안료)을 씌워 백불(白佛)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근한 인상의 석불좌상은 약함(중생의 갖은 병을 고치는 약이 들어 있는 통)을 왼손에 들고 있어 그가 약사여래(藥師如來)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월암 석불좌상은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1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사의 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대략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명문이 있는 조선후기 석불로서 매우 중요한 예라고 합니다.
만월보전 앞에는 샘터가 있습니다. 보통 사찰처럼 석조에 담긴 맑은 물이 아닌 수도꼭지로 물을 틀어서 마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월암을 거쳐 가는 지친 등산객들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존재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물 한잔을 마시고, 하산하기 전에 고개를 돌려 암자를 둘러 봅니다. 묵직하고 고요한 바위 밑에서 그 무게조차 가볍게 만들어주는 법당의 분위기가 깊은 산골 여염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쉬었다 갈 수 있는 작은 툇마루와 석불좌상의 인자함이 경내를 감싸고 있어 돌계단을 오르느라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가벼워집니다.
도봉산 탐방센터에서 만월암까지의 거리는 2.5km 정도 됩니다. 암자를 탐방하며 긴 시간 동안 소란스럽지 않은 산속에서 가진 걸 내려놓으며 수행했을 불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쌓은 정갈함이 속세에서 도망쳐 온 이들이나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고달픔을 달래주는 위로로 다가갔을 테지요.
천년 고찰 길의 산행은 글 한 편에 다 싣기에 아쉬움이 남는 길입니다. 비움의 끝자락, 늦가을이 가기 전 다시 한번 도봉산을 찾아보려 합니다. 고승들의 수행처 무문관을 거느린 천축사와, 도봉사를 탐방하며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들의 고달픔을 달래주고, 삶에 지친 발걸음을 위로해 주었던 천년고찰 산행에 벌써 설렙니다.

<기록 송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