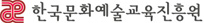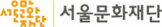지역문화 아카이빙 프로젝트
도봉 아키비스트가 기록하는 도봉의 인물과 공간
지역문화 아카이빙은 도봉이 품은 다양한 문화의 가능성과 지역 자원을 주민이 직접 탐색,
기록하고 구성하여 중요한 홍보 자산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록하고 구성하여 중요한 홍보 자산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헌책방 '외갓집에 가자' -작은 도서관 탐방기
정지실 |2020-11-26 | 조회 888
마을버스 01번을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쌍문 마당의 너른 모래밭이 펼쳐진다. 포크레인과 공사장 소음, 먼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축제와 행사가 없을 때에는 동네 공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뒤편에는 나선형 모양의 ‘키친 가든’이란 이름의 도시공원 준비도 한창이었다.

쌍문1동 마을마당
그 옆으로 ‘도봉구 우이천로 44길’의 좁은 골목길이 시작된다. 그곳에는 여성 안심 거리를 알리는 시트지들이 롤리팝 마냥 여기저기서 전봇대를 휘감고 있었다. LED 폐쇄회로와 비상벨, 각종 경고 문구들을 보고 있자니 시원했던 가을바람도 어쩐지 조금 스산하게 느껴졌다.

여성안심 쌍문모람(사람이 모이는)길
목적지인 작은 도서관을 찾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까닭에 만복이 온다는 계단 끄트머리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계단 꼭대기에 올라서니 동네의 모습과 산세가 한눈에 펼쳐 보인다. 왜 만복인지 알 것도 같다. 밑으로는 도봉산 진경이 그려져 있는 벽화와 감나무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양이도 보였다. 손님이 오시면 7가지 보물을 대접한다는 희망쟁반, 감나무, 희망슈퍼, 텃밭, 계단, 빗물 저장통들이 어렵사리 눈에 들어왔다. 숨은그림찾기마냥 제법 난이도가 있는 골목이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모를 후미진 골목 사이로, 주민들의 일상과 그 간의 노력들이 보이는 듯 했다.

도봉구 쌍문동 '희망 골목길' (주민주도 골목길 가꾸기)
골목을 한참 헤매고도 번지수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집 안에서 작업을 하시던 분들께 여쭈어보았다. 맞은편 집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문 밖까지 나오셔서 내가 찾는 곳을 일러주셨다. 그제야 번지수 빠진 주소지들이 얼굴을 내보이기 시작했고 스러져 가는 모양새의 붉고 낮은 담벼락을 찾을 수 있었다. 이내 한 눈에 들어온 것은 도서관 간판과 소담하고 하얀 문이었다. 연락처를 찾기가 힘들어 휴관일지도 모른다는 어둑한 불안감은 실내를 비추던 환한 주황색 조명 빛으로 금세 녹아내려 버렸다.

헌책방&작은도서관 '외갓집에 가자'(우이천로44길 26)
‘외갓집에 가자’는 이렇게 자그마한 도서관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만큼 아주 작은 도서관이었다. 작은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방학 때면 외할머니댁에 가서 모기향 하나 피워놓고 밤새도록 할머니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금방이라도 어느 틈새에서 툭 하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도서관은 오래된 주택 반지하에 있었다. 실내로 들어서니 코로나 때문인지 이용객은 아무도 없었고, 운영자이신 신경애 선생님이 홀로 반겨 주었다. 작은 탁자와 낮은 의자에 노트와 필기도구를 내려놓으시고 어디서 왔느냐 물어 오신다. 짧은 통성명을 한 뒤 인터뷰를 청했으나 그간의 수많은 인터뷰 때문인지 먼저 손사래를 치신다.

'외갓집에 가자' 외관
신경애 선생님은 친정 어머님이 사셨던 이곳을 통해 아이들에게 외가집 같은 곳을 마련해주고 싶으셨다고 한다. 비치되어 있는 책들은 주로 선생님이 그간 읽어 오셨던 손때 묻은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2018년 헌책방으로 문을 열었으나 보유 도서가 차차 늘어나면서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란다. 책등에 청구기호 라벨이 붙은 것은 대출용으로 하고 있고, 이 밖의 것은 판매용이라고 한다.
선생님은 예전에 청소년시설의 책임을 맡아 일을 한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살려 책을 통한 소통의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시게 됐다고 한다. 책방 2층에는 시 공부를 통해 사람들과 현대 시를 감상하거나 창작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목요포럼을 통해 정기적인 독서 토론의 장도 열고 있다. 앞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조용히 도서관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도서관은 선생님처럼 간결하고 깔끔했다. 서가가 그동안 하나가 더 늘어 이용자들이 늘어져 편히 읽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었다. 대신 등을 맞대고 읽을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공간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는 뭔가 소곤소곤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걸음걸이 또한 사뿐사뿐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전체를 둘러보니 우선 헌책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맞은편 서가에는 사회과학이며 철학책들도 보이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도 있었다.
서가를 바라보는 자리에는 액자 하나가 있었다. ‘志山心水(지산심수)’. ‘뜻은 산같이 마음은 물처럼 살자’라는 의미로 선생님 댁의 오랜 가훈이라고 한다. 이 도서관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어주는 문장이었다.

작은 도서관 '외갓집에 가자' 내부
그 밑에는 선생님이 그동안 읽어 오셨던 책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각의 칸에는 선생님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그간의 삶을 보여주는 소박한 소품들도 있었다. 잠시 내가 작은 도서관을 꾸민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베스트셀러가 난무하고 소비 상품이 즐비한 대형서점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자신만의 색이 담긴 아주 작고 작은 도서관... 이곳의 이름 때문이었을까? 코로나가 지나간 삭막한 도시 속에서도 할머니의 손길에 위안을 받은 느낌이었다. 이런 도서관이 동네에 있다고 생각하니, 언제든 달려가 응석을 부리고 싶은 외갓집을 지척에 둔 것 같아 훈훈한 마음으로 발길을 되돌릴 수 있었다.

내려오는 길에 낮은 담벼락에서 감을 따고 계신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만나 감 세 알을 선물로 받았다.
쌍수교 다리 위에서는 짐을 끌고 가시던 힘든 할머니를 친절히 도와드리는 남학생들도 발견했다. 가을 선물을 듬뿍 받은 기분이 들었다.
<기록 정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