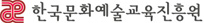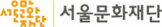지역문화 아카이빙 프로젝트
도봉 아키비스트가 기록하는 도봉의 인물과 공간
지역문화 아카이빙은 도봉이 품은 다양한 문화의 가능성과 지역 자원을 주민이 직접 탐색,
기록하고 구성하여 중요한 홍보 자산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록하고 구성하여 중요한 홍보 자산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방예리에 깃든 고즈넉한 저녁 햇살 같은 공간, 헌책방 '근현대사 서점'
이혜경 |2020-11-16 | 조회 908
반짝이는 방예리 공방들
오후 3시쯤의 햇살이 좋아 그 시간이면 산책을 하곤 한다. 곧잘 내 발길이 닿는 곳은 ‘방예리’. ‘방학천 문화 예술거리’를 줄인 말이다. 그 곳에 가면 방학천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다.
방예리는 20년 가까이 유흥가 밀집 지역이었고 우범지대라 주민들이 불안해하던 거리였다. 흔히 빨간집이니 방석집으로 불리던 유흥업소들이 30개가 넘게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까지의 이야기다.
2016년부터 민관이 합심해서 단속하고 폐업을 설득하고 전업을 유도하면서 거리 정비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남았던 31번째의 업소가 2017년에 폐업을 하고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러워 오기를 꺼리던 거리가 이제 누구나 즐겨 찾는 주민들의 산책로가 되었다. ‘방예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상큼하게 거듭난 것이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창문 하나 없던 유흥업소들이 유리문으로 환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공방이나 가게가 되었다. 가게에서는 쿠키를 굽거나 강정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는 공방도 보이고 생활도자기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공방 옆에는 아담한 카페도 문을 열었다. ‘방예리’의 가게와 공방들은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하얀 양말을 신은 소녀 같은 모습으로 반짝이고 있다.

방예리 표지판이 보인다. 파스텔 톤으로 꾸며진 '방예리 지원센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창 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다.
할머니 옷 색깔 때문인지 할머니도 방예리와 함께 반짝이는 느낌이다.
고즈넉하게 스민 저녁 햇살 같은 공간
그런 곳에서 내가 들르고 싶은 곳은 생뚱맞게도 헌책방이다. 헌책방의 이름은 ‘근현대사 서점’이다. 공방들과는 방학천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모서리에 있다. 반짝이는 방예리에 고즈넉하게 스미는 저녁 햇살마냥 60년대식 상호에 60년대식 간판을 달고 있다.
 방예리 헌책방 <근현대사 서점>
방예리 헌책방 <근현대사 서점> 바닥에 널브러진 책들을 주인아저씨가 묵묵히 정리하고 있다.
그 간판을 보면서 근현대사 역사서 전문 서적을 파는 곳인가 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헌책방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왔다. 주인아저씨처럼 보이는 분이 서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바닥에 널브러진 책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른 듯한 체구와 소박한 차림새가 서점과 닮은 분위기다.
상호가 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곳은 근현대사 역사서를 전문으로 파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냥 헌책방입니다.”
그랬다. 그냥 헌책방이었다.
서점 좀 구경해도 되냐고 여쭈어 보니 “아, 그럼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다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라며 미안한 듯 대답하셨다.
깔끔하면 헌책방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들어가 보았다. 주인아저씨가 바깥에 나와 있는 이유를 알았다. 서점 안에는 책과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주인아저씨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통로는 딱 한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었다. 책장에 꽂힌 책들만큼이나 바닥에서 위로 쌓여 있는 책들도 넘쳐났다. 내가 가본 헌책방 중에서 가장 헌책방다웠다.

책들로 가득한 비좁은 통로와 어쩌면 밤새워 공부했을 사전들.
책 주인을 상상하는 즐거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마당 깊은 집’, ‘갈매기의 꿈’ 이런 제목의 책들을 만나니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한때 내 심장의 박동수를 높이던 책들을 보며 그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사전류들은 주로 바닥에 쌓여 있었다. 사전을 샀던 책 주인이 굳은 결심을 하고 영어의 달인이 되어보겠다며 사전을 찾아보고 뒤적였을 마음들이 훅 다가왔다. 또 한편으로는 작심삼일로 며칠 열심히 공부하다 영어는 내 것이 아닌가 봐 하고 던져버린 사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빽빽하게 꽂힌 책들을 둘러보다 몇 권을 집어 들었다. 꼭 읽겠다는 것보다 그 책들에게서 느껴지는 아련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며칠 전에도 들러 이런저런 책을 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프랑스어 기초 문법책이었다. 책 안에는 공부한 흔적들이 있었다. 프랑스어에 심취했던 젊은 날의 내 모습도 그곳에 있었다. 그 책을 뒤적이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책 주인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기분이 들었다. 헌 책이 주는 이런 느낌이 참 좋다.
오래오래 보고 싶다.

주인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찍어본 사진.
분홍색 플라스틱 의자가 귀엽다. 원래 두 개였는데 동네분이 예쁘다고 해서 주고 남은 하나란다.
가게 문에 적힌 대로 책뿐 아니라 오래된 다른 물건들도 있는 곳이다.
많은 헌책방들이 사라지고 있다. 부산 보수동 헌책방거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왠지 동네 어귀의 오래된 나무가 사라지는 기분이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다 버려져야 할 것은 아니다. 훈훈한 정과 추억을 담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들이기도 하다.
방예리를 거닐 때마다 멀리서도 보이는 ‘근현대사 서점’ 간판에 절로 눈길이 간다. 그리고 마음이 아늑해진다. 가게 문 밖에 낡은 물건들이 널브러진 풍경과 그 물건들을 거의 고개도 들지 않고 말없이 느린 동작으로 챙기는 아저씨의 모습은 한 편의 무성 영화 같다. 낡은 필름이 돌아가는 듯한 그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다.
<기록 이혜경>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우이성당 고양이와 동네 사람들 (1) -고양이 엄마, 이도미
우이성당 고양이와 동네 사람들 (1) -고양이 엄마, 이도미